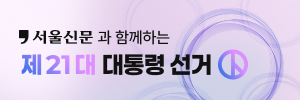대학생들의 ‘알바’ 문제를 보도한 기사(경향신문 1975년 6월 18일자).
1950년대에 사환 근무, 찹쌀떡·메밀묵·우유·담배·만년필 장사, 신문팔이, 구두닦이는 중고생들이 주로 했다. 대학생들은 가정교사나 야학 교사, 타이프라이터, 번역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구하기 어려웠다. 밤거리를 누비며 행상 일로 학비를 벌어야 했다. 서울역에서 지게꾼 일도 했다. 선거철이 되면 선거 운동원의 절반이 혈기왕성한 대학생들로 채워지곤 했다.
누드 모델을 불건전한 직업이라고 할 순 없지만, 건전하지 않은 일로 돈을 버는 학생들도 없지 않았다. 일부 여학생은 비어홀이나 카바레, 요정 등 유흥업소에서 일했다. 직업소개서를 찾은 여학생을 윤락가로 넘긴 사건도 있었다. 돈 받고 자신의 피를 파는 매혈(賣血)은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길이었다. 1950년대 초 댄스 열풍이 불었을 때 카바레에서 학생, 깡패, 제비족을 포함한 젊은 남성이 가정부인이나 여학생을 유인하는 행위를 ‘아르바이트’, 그런 카바레를 ‘아르바이트홀’이라고 불렀다. 번성하던 아르바이트홀과 사창가 실태를 둘러본 윤치영 서울시장이 남긴 말은 “할 말이 없소이다”였다(경향신문 1964년 12월 17일자).
1970년대 들어 아르바이트도 다양해졌다. 연구소 조사원, 시간제 사무직, 안내원, 도난경보기 외판원, 바텐더, 디스크자키, 연말연시 카드 판매 등이다. 백화점 거리 선전원이나 판매원으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대생들이 인기였다. 다방을 종일 빌려 차를 파는 1일 찻집이 등장한 것은 1970년대 초다. 미팅에도 이용되는 다방 티켓을 많게는 1000장을 팔아 수입이 적지 않았다. 골프장 캐디로 일하는 여학생들이 있었다. 서울에 캐디 학원이 한 곳 있었다(동아일보 1975년 10월 27일자).
1980년 과외가 금지돼 대학생들은 큰 타격을 받았다. 음식 배달, 집 봐주기, 세탁물 수거, 학습지 확장 요원 등 새 일자리를 찾아야 했고, 방학 때 중동 건설 현장에서 뛰기도 했다(매일경제 1981년 12월 21일자). 대학들은 ‘아르바이트 조합’, ‘아르바이트 개발위원회’를 만들어 일자리 찾기를 도왔다.
손성진 논설고문 sonsj@seoul.co.kr
2019-04-15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