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리뷰] 창극 ‘트로이의 여인들’ 4년 만의 귀환
옹켕센 연출 싱가포르·네덜란드 등서 찬사인물별 악기 하나… 소리꾼 에너지에 집중

국립창극단 제공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공연 중인 창극 ‘트로이의 여인들’은 그리스·스파르타 연합군과 10년간 전쟁을 벌인 뒤 참패한 트로이에 남겨진 여인들의 한을 절절하게 그려 낸다. 트로이의 여인들과 마지막 왕비 헤큐바(가운데·김금미 분)의 소리는 강렬하게 국악기와 어우러진다.
국립창극단 제공
국립창극단 제공
창극 ‘트로이의 여인들’은 판소리라는 장르가 가진 힘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작품이다. 우선 무대를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한 시도는 성공적이었다. 애초 출발부터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만큼 서구는 물론 여러 문화권에서 익숙한 에우리피데스의 그리스 비극을 소재로 했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불씨가 돼 트로이와 그리스·스파르타 연합군이 10년간 벌인 참혹한 전쟁의 상흔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재로 충분했다.
싱가포르예술축제 예술감독을 맡고 있던 옹켕센의 연출로 2016년 11월 국립극장에서 초연한 뒤 2017년 싱가포르, 2018년 영국·네덜란드·오스트리아의 페스티벌 무대에서 찬사를 받았다. 올해 프랑스와 미국 공연도 초청됐지만 코로나19로 이뤄지지 못했고 지난 3일부터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국내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전 세계로 넓힌 무대를 가득 채우는 음악은 오롯이 우리 전통 판소리였다. 흰색 바탕 무대와 여인들의 흰색 의상은 매우 단출하다. 움직임도 최소화해 소리꾼들의 에너지를 온전히 소리에 담았다. 판소리를 세계적인 음악으로 알리고 싶다는 옹 연출의 주문도 더해진 결과다.

국립창극단 제공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공연 중인 창극 ‘트로이의 여인들’은 그리스·스파르타 연합군과 10년간 전쟁을 벌인 뒤 참패한 트로이에 남겨진 여인들의 한을 절절하게 그려 낸다. 전쟁의 씨앗이 된 헬레네(김준수 분)를 감싸는 스파르타 메넬레우스 왕(최호성 분)의 소리는 애절하게 국악기와 어우러진다.
국립창극단 제공
국립창극단 제공
처절한 분노와 슬픔이 극대화되는 110분, 결국 신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잔인한 운명 앞에 선 여인들의 절규는 관객들의 기력까지 쏙 빼놓을 만큼 몰입도가 높다. 헤큐바와 여인들은 끝내는 “버티어 서라! 우리는 누구도, 아무도, 제 발로 걸어 트로이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외친다. 어떤 운명이 닥쳐도 버티어 선다는 트로이 여인들의 힘이 어쩐지 지금 우리에게 주는 용기 같기도 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12-07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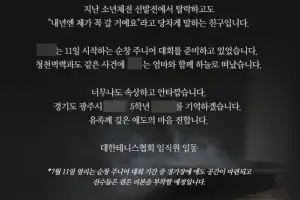

![thumbnail - “이게 왜 여기서 나와?” 경악…펄펄 끓는 동해서 무슨 일이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7/10/SSC_20250710135853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