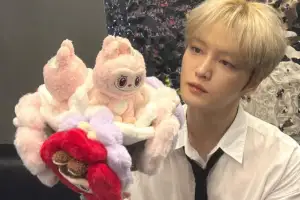мҡ°лҰ¬м—җкІҢ к°ҖмһҘ м№ңмҲҷн•ң м•јмғқмҙҲлҘј кјҪм•„ ліҙлқј н•ҳл©ҙ м•„л§Ҳ лӢӨм„Ҝ мҶҗк°ҖлқҪ м•Ҳм—җ м ң비кҪғмқҙ л“Өм§Җ м•Ҡмқ„к№Ң? н’ҖмһҺл“Өмқҙ нҢҢлҰҮнҢҢлҰҮ лҸӢм•„лӮ л¬ҙл ө, м ң비к°Җ лҸҢм•„мҳЁлӢӨлҠ” мӮјмӣ” мӮјм§ҮлӮ мҰҲмқҢмқҙл©ҙ м ң비кҪғмқҙ н•ҖлӢӨ. м–ҙл–Ө мқҙлҠ” м ң비 лӘЁм–‘мқ„ к°–м¶”кі мһҲм–ҙм„ң м ң비кҪғмқҙлқј н•ңлӢӨм§Җл§Ң м•„л¬ҙлҰ¬ м ң비кҪғм—җ м ң비лҘј кІ№міҗліҙм•„лҸ„ к·ёлҰјмқҙ лӮҳмҳӨм§Җ м•ҠлҠ”лӢӨ. м•„л§Ҳ м ң비к°Җ лҸҢм•„мҳ¬ л¬ҙл өмқҙл©ҙ мҡ°лҰ¬лӮҳлқј м–ҙл””м„ңкі мһ‘м§Җл§Ң нҷ”мӮ¬н•ҳкІҢ н”јм–ҙлӮҳ лҙ„мқ„ м•Ңл ӨмЈјкё° л•Ңл¬ём—җ л¶ҷ여진 мқҙлҰ„мқҙ м•„лӢҗк№Ң мӢ¶лӢӨ.

м ң비кҪғ
![м ң비кҪғ]()
мһҘлӮңк°җмқҙ нқ”н•ҳм§Җ м•ҠлҚҳ мҳӣ мӢңм Ҳм—җ м ң비кҪғмқҖ м–ҙлҰ° м•„мқҙл“Өмқҳ мһҘлӮңк°җмңјлЎңлҸ„ нӣҢлҘӯн•ң лӘ«мқ„ н•ҙлӮҙм—ҲлӢӨ. м ң비кҪғм—җкІҢлҠ” м•Ҳ лҗҳм—Ҳм§Җл§Ң м–ҙлҰ° мӢңм Ҳ м ң비кҪғмқ„ л”°м„ң л‘җ мҶЎмқҙлҘј м—Үкұём–ҙ вҖҳкҪғм”ЁлҰ„вҖҷмқ„ н•ҳкё°лҸ„ н–Ҳкі , кҪғл°ҳм§ҖлҘј л§Ңл“Өкё°лҸ„ н–ҲлӢӨ. к·ёлһҳм„ң м ң비кҪғмқ„ л°ҳм§ҖкҪғмқҙлқјкі лҸ„ н•ңлӢӨ. кҪғмқҙ м§Җкі м”Ём•—мқҙ л§әнһҲл©ҙ м”ЁлҘј л”°м„ң вҖҳмҢҖл°ҘлҶҖмқҙвҖҷлҸ„ н–ҲлӢӨ. м”Ём•—мқ„ мғҒлҢҖм—җкІҢ ліҙм—¬мЈјкі мҢҖл°Ҙмқём§Җ ліҙлҰ¬л°Ҙмқём§Җ м•Ңм•„л§һнһҲлҸ„лЎқ н•ҳм—¬ м”Ём•—мқ„ мҶҗнҶұ лҒқмңјлЎң к№Ңм„ң лҚң м—¬л¬ё н•ҳм–Җмғү(мҢҖл°Ҙ)мқём§Җ мһҳ мқөмқҖ к°Ҳмғү(ліҙлҰ¬л°Ҙ)мқём§ҖлҘј нҷ•мқён•ҳлҠ” лҶҖмқҙлӢӨ. л¬јлЎ м§ҖкёҲмқҖ мӮ¬лқјм§„ н’ҚкІҪмқҙлӢӨ.
к·ёлҹ°к°Җ н•ҳл©ҙ м ң비кҪғмқҖ м–ҙлҰ° мҲңмқҖ лӮҳл¬јлЎң лЁ№кё°лҸ„ н•ҳкі мң л°©м—ј л“ұ л¶Җмқёлі‘кіј мӨ‘н’Қ, мқҙм§Ҳ, м„ӨмӮ¬, 진нҶө, мқёнӣ„м—ј л“ұмқҳ м№ҳлЈҢм—җ м•Ҫмһ¬лЎң мӮ¬мҡ©н•ҳл©° л°ңмңЎмҙү진м ң, к°„мһҘкё°лҠҘмҙү진м ңлЎң м“°мқёлӢӨкі н•ңлӢӨ. мҡ”мҰҲмқҢмқҖ мӢқмҡ©кҪғмңјлЎң л°Ҙм—җ л„Јм–ҙ кҪғл°Ҙмқ„ н•ҙлЁ№кё°лҸ„ н•ңлӢӨ. нҷ”м „мқ„ л¶Җм№ҳлҠ” лҚ°лҸ„ м“°м—¬ н•ҳм–Җ л–Ў мң„м—җ лҶ“мқё кҪғмһҺмқҖ лЁ№кё°м—җлҸ„ м•„к№Ңмҡ°лҰ¬ л§ҢнҒј кіұлӢӨ. мқҙмҜӨ лҗҳл©ҙ мҡ°лҰ¬ лҜјмЎұкіјлҠ” л–јл Өм•ј л—„ мҲҳ м—ҶлҠ” м•јмғқмҙҲлқјлҠ” кІҢ мһ…мҰқлҗң м…ҲмқҙлӢӨ.
к·ёлҹ° м ң비кҪғмқҙ м°ё м–өмҡён•ң лҳҗ лӢӨлҘё мқҙлҰ„мқ„ к°–кі мһҲлӢӨ. мқҙлҰ„н•ҳм—¬ вҖҳмҳӨлһ‘мәҗкҪғвҖҷмқҙлӢӨ.
- кёҙ м„ёмӣ”мқ„ мҳӨлһ‘мәҗмҷҖмқҳ мӢёнқ м—җ мӮҙм•ҳлӢӨлҠ” мҡ°лҰ¬мқҳ лЁём–ё мЎ°мғҒл“Өмқҙ л„ҲлҘј л¶Ҳлҹ¬ вҖҳмҳӨлһ‘мәҗкҪғвҖҷмқҙлқј н–ҲмңјлӢҲ м–ҙм°Ң ліҙл©ҙ л„Ҳмқҳ л’Өг……лӘЁм–‘мқҙ лЁёлҰ¬нғңлҘј л“ңлҰ¬мқё мҳӨлһ‘мәҗмқҳ л’Өг……лЁёлҰ¬мҷҖлҸ„ к°ҷмқҖ к№ҢлӢӯмқҙлқј м јн•ңлӢӨ -
м•„лӮҷлҸ„ мҡ°л‘җлЁёлҰ¬лҸ„ лҸҢліј мғҲ м—Ҷмқҙ к°”лӢЁлӢӨ
лҸ„лһҳмғҳлҸ„ лқім§‘лҸ„ лІ„лҰ¬кі к°• кұҙл„ҲлЎң м«“кІЁ к°”лӢЁлӢӨ
кі л Ө мһҘкө°лӢҳ л¬ҙм§Җл¬ҙм§Җ мІҳл“ңлҹ¬мҷҖ
мҳӨлһ‘мәҗлҠ” к°Җлһ‘мһҺмІҳлҹј көҙлҹ¬ к°”лӢЁлӢӨ
кө¬лҰ„мқҙ лӘЁнҳҖ кіЁм§қ кіЁм§қмқ„ кө¬лҰ„мқҙ нқҳлҹ¬
л°ұ л…„мқҙ лӘҮ л°ұ л…„мқҙ л’ӨлҘј лӢҲм–ҙ нқҳлҹ¬к°”лӮҳ
л„ҲлҠ” мҳӨлһ‘мәҗмқҳ н”ј н•ң л°©мҡё л°ӣм§Җ м•Ҡм—ҲкІғл§Ң
мҳӨлһ‘мәҗкҪғ
л„ҲлҠ” лҸҢк°Җл§ҲлҸ„ н„ёл©”нҲ¬лҰ¬лҸ„ лӘ°мңјлҠ” мҳӨлһ‘мәҗкҪғ
л‘җ нҢ”лЎң н•ҙг……л№ӣмқ„ л§үм•„ мӨ„к»ҳ
мҡём–ҙліҙл ҙ лӘ©лҶ“м•„ мҡём–ҙлӮҳ ліҙл ҙ мҳӨлһ‘мәҗкҪғ
мқҙмҡ©м•… <мҳӨлһ‘мәҗкҪғ>м „л¬ё

кі к№”м ң비кҪғ
![кі к№”м ң비кҪғ]()

лӮЁмӮ°м ң비кҪғ
![лӮЁмӮ°м ң비кҪғ]()

л…ёлһ‘м ң비кҪғ
![л…ёлһ‘м ң비кҪғ]() мқҙмҡ©м•…мқҳ мқҙ <мҳӨлһ‘мәҗкҪғ>мқҙ л°”лЎң м ң비кҪғмқҙлӢӨ. мӢң ліёл¬ём—җ м•һм„ң н•ҙм„Ө л¶Җ분мқҙ л°”лЎң м ң비кҪғмқҳ мғқк№ҖмғҲлҘј л§җн•ҙмЈјкі мһҲлӢӨ. лӘЁм–‘кіј мғүк№”кіј нҒ¬кё°лҠ” лӢӨм–‘н•ҙлҸ„ м ң비кҪғмқҳ к°ҖмһҘ нҒ° нҠ№м§•мқҖ кҪғ л’·л¶Җ분м—җ лҸҢм¶ңлҗҳм–ҙ мһҲлҠ” мқҙ кҝҖмғҳм—җ мһҲлӢӨ. мҳӨлһ‘мәҗмқҳ ліҖл°ңлЁёлҰ¬мІҳлҹј нҠҖм–ҙлӮҳмҷҖ мһҲлҠ” кІғмқҙлӢӨ.
мқҙмҡ©м•…мқҳ мқҙ <мҳӨлһ‘мәҗкҪғ>мқҙ л°”лЎң м ң비кҪғмқҙлӢӨ. мӢң ліёл¬ём—җ м•һм„ң н•ҙм„Ө л¶Җ분мқҙ л°”лЎң м ң비кҪғмқҳ мғқк№ҖмғҲлҘј л§җн•ҙмЈјкі мһҲлӢӨ. лӘЁм–‘кіј мғүк№”кіј нҒ¬кё°лҠ” лӢӨм–‘н•ҙлҸ„ м ң비кҪғмқҳ к°ҖмһҘ нҒ° нҠ№м§•мқҖ кҪғ л’·л¶Җ분м—җ лҸҢм¶ңлҗҳм–ҙ мһҲлҠ” мқҙ кҝҖмғҳм—җ мһҲлӢӨ. мҳӨлһ‘мәҗмқҳ ліҖл°ңлЁёлҰ¬мІҳлҹј нҠҖм–ҙлӮҳмҷҖ мһҲлҠ” кІғмқҙлӢӨ.
вҖңмҳӨлһ‘мәҗмқҳ н”ј н•ң л°©мҡё л°ӣм§Җ м•Ҡм—ҲкІғл§ҢвҖқ мҳӨлһ‘мәҗмқҳ лЁёлҰ¬ лӘЁм–‘кіј лӢ®м•ҳкё° л•Ңл¬ём—җ мҳӨлһ‘мәҗкҪғмқҙлқј л¶ҲлҰ¬лҠ” кІғмқёлҚ°, мҡ°лҰ¬ лҜјмЎұмқҙ мқјм ңмқҳ нғ„м••мңјлЎң мқён•ҙ к·ё мҳӣлӮ кі л Ө мһҘкө°м—җкІҢ м«“кё°лҚҳ мҳӨлһ‘мәҗмҷҖ к°ҷлӢӨлҠ” нҳ„мӢӨ мқёмӢқмқҙ мқҙ мӢңмқҳ мЈјмҡ” лӮҙмҡ©мқ„ мқҙлЈЁкі мһҲлӢӨ. мқјм ңм—җ мқҳн•ҙ мҳӨлһ‘мәҗ м·Ёкёүмқ„ л°ӣмңјл©° лӮҳлқјлҸ„ мһғкі л– лҸҢлҚҳ мң лһ‘лҜј мӢ м„ё, мЎ°м„ лҜјмӨ‘мқҳ м–өмҡён•Ёкіј 비нҶөн•Ёмқ„ м•”мӢңн•ҳлҠ” кІғмқҙ вҖҳмҳӨлһ‘мәҗкҪғвҖҷмқё кІғмқҙлӢӨ. вҖңмҡё л°‘м—җ лҙүм„ нҷ”вҖқмҷҖ к°ҷмқҖ мқҙлҜём§Җлқјкі лӮҳ н• к№Ң.
м–‘м§Җ мӘҪмқ„ л”°лқј лӢҙ л°‘м—җлҸ„ мһҘлҸ…лҢҖм—җлҸ„ н”јкі , мӢңл©ҳнҠё лё”лЎқ нӢҲм—җлҸ„ л¬ҙлҚӨк°Җм—җлҸ„ мӮ°л№„нғҲмқҙлӮҳ лҶ’мқҖ мӮ°м—җлҸ„ н”јм–ҙлӮңлӢӨ. мҪ©м•Ңл§Ңн•ң мҪ©м ң비кҪғм—җм„ң нҒјм§Ғн•ң мӮјмғүм ң비кҪғ, н•ҳм–Җ лӮЁмғүм ң비кҪғ, м – л№ӣк№”мқҳ нқ°м –м ң비кҪғ, лҶ’мқҖ мӮ°м—җм„ңл§Ң мЈјлЎң мһҗлқјлҠ” л…ёлһ‘м ң비кҪғ, м§ҖлҰ¬мӮ° нҷ”м—„мӮ¬ к·јл°©м—җм„ң мһҗмғқн•ңлӢӨ н•ҙм„ң нҷ”м—„м ң비кҪғ л“ұл“ұ к·ё мһҺмқҳ лӘЁм–‘лҸ„ к°Җм§Җк°Җм§Җкі кҪғмқҳ лӢӨм–‘н•ң нҒ¬кё°лӮҳ мғүк№”л§ҢнҒјмқҙлӮҳ к·ё мқҙлҰ„ лҳҗн•ң м—¬лҹ¬ к°Җм§ҖмқҙлӢӨ. мқҙлҠ” лӘЁл‘җ м ң비кҪғмқҳ к°•н•ң лІҲмӢқл Ҙкіј мғқлӘ…л Ҙм—җм„ң 비лЎҜлҗң кІғмқёлҚ° м ң비кҪғл§ҢнҒј к°•н•ң лІҲмӢқл Ҙкіј мғқлӘ…л Ҙмқ„ к°Җ진 м•јмғқмҙҲлҸ„ л“ңл¬јм§Җ м•Ҡмқ„к№Ң н•ңлӢӨ.
м ң비кҪғмқҖ 4мӣ”кіј 5мӣ”м—җ н•ҖлӢӨ. к·ёлҰ¬н•ҳм—¬ м•”мҲ м—җ мҲҳмҲ мқҳ кҪғл°Ҙмқҙ мӢӨл ӨмҷҖ м”Ём•—мқ„(к°ңл°©нҷ”) л§әлҠ”лӢӨ. к·ёлҹ¬лӮҳ кҪғмІ мқҙ м§ҖлӮҳ кҪғмқҙ н”јм§Җ м•Ҡм•„лҸ„ кҪғмқҙ л§әнһҲлҠ” л“Ҝн•ҳлӢӨк°Җ кҪғмқҖ н”јм§Җ м•Ҡкі кі§л°”лЎң м”Ём•—мқҙ л§әнҳҖ(нҸҗмҮ„нҷ”) м—¬л¬ёлӢӨ. м°ё мӢ кё°н•ң лІҲмӢқ л°©лІ•мқҙлӢӨ. лӢӨлҘё к°ңмІҙмҷҖ кҪғк°ҖлЈЁл°ӣмқҙлҘј н•ҳм—¬ лӢӨм–‘н•ң мң м „мһҗлҘј л°ӣм•„л“Өм—¬ мў…мЎұмқ„ мқҙм–ҙк°ҖлҠ”к°Җ н•ҳл©ҙ н•ңнҺёмңјлЎ мһҗкё° мҠӨмҠӨлЎң кҪғк°ҖлЈЁл°ӣмқҙлҘј н•ҳм—¬ мҲңмҲҳнҳҲнҶөмқ„ мқҙм–ҙк°Җкё°лҸ„ н•ҳлҠ” кІғмқҙлӢӨ. кҪғмқ„ н”јмҡ°м§Җ м•Ҡкі лҸ„ м”Ём•—мқ„ л§әлӢӨлӢҲ, лҶҖлһҚм§Җ м•ҠмқҖк°Җ? к·ёлҹ° мӢқл¬јмқҙ лҚ”лҹ¬ мһҲлӢӨкі н•ңлӢӨ. кі л§ҲлҰ¬лҸ„ мғҲмҪ©лҸ„ к°ңнҷ”мҷҖ н•Ёк»ҳ нҸҗмҮ„нҷ”лЎң м”Ём•—мқ„ л§әкё°лҸ„ н•ңлӢӨ. к°ңл°©нҷ”лҠ” м—ҙл§ӨлҘј л§әмқ„ нҷ•лҘ мқҙ к·ёлҰ¬ лҶ’м§Җ м•ҠмқҖ л°ҳл©ҙ нҸҗмҮ„нҷ”лҠ” л§Өмҡ° лҶ’лӢӨкі н•ңлӢӨ.
мқҙ м”Ём•—мқҖ мқөмңјл©ҙ н„°м ём„ң л©ҖлҰ¬ нқ©м–ҙм§ҖлҠ”лҚ° мһ¬лҜёмһҲлҠ” мӮ¬мӢӨмқҖ мқҙ м”Ём•—мқ„ л„җлҰ¬ нҚјлңЁлҰ¬лҠ” лҚ°м—җ к°ңлҜёк°Җ лҸ„мҷҖмӨҖлӢӨлҠ” кІғмқҙлӢӨ. мқҙ м ң비кҪғмқҳ м”Ём•—м—җлҠ” к°ңлҜёк°Җ мўӢм•„н•ҳлҠ” вҖҳм–јлқјмқҙмҳӨмўҖвҖҷмқҙлқјлҠ” лӢЁл§ӣмқҙ лӮҳлҠ” л¬јм§Ҳмқҙ 묻м–ҙ мһҲлҠ”лҚ° к°ңлҜёк°Җ мқҙкІғмқ„ лЁ№кё° мң„н•ҳм—¬ м”Ём•—мқ„ л¬јкі к°”лӢӨк°Җ м—¬кё°м Җкё° м”Ём•—мқ„ мҳ®кІЁлҶ“лҠ”лӢӨкі н•ңлӢӨ. м–јл Ҳм§ҖлӮҳ к№Ҫк№Ҫмқҙн’ҖлҸ„ к·ёл Үл“Ҝмқҙ к°ңлҜёк°Җ лҸ„мҷҖмӨҖлӢӨ. кіөмғқкҙҖкі„м—җ мһҲлҠ” кІғмқҙлӢӨ. м ң비кҪғмқҖ мҷ•м„ұн•ң лІҲмӢқл Ҙкіј н•Ёк»ҳ лӢӨлҘё лҸҷл¬јмқҳ лҸ„мӣҖк№Ңм§Җ кІ№міҗ к·ё мў…мЎұмқ„ лІҲм°Ҫн•ҳкІҢ л§Ңл“ңлҠ” лҚ° к°ҖмһҘ мңјлңёмқј мҲҳл°–м—җ м—ҶлҠ” кІғ м•„лӢҢк°Җ мӢ¶лӢӨ.
лҙ„мқҙлӢӨ. мӢңмқё м•ҲлҸ„нҳ„мқҳ мӢңм—җм„ңмІҳлҹј вҖңм ң비кҪғмқ„ лӘ°лқјлҸ„ лҙ„мқҖ мҳӨкі м ң비кҪғмқ„ м•Ңм•„лҸ„ лҙ„мқҖ к°„лӢӨ.вҖқ к·ёлҹ¬лӮҳ лӢӨ к°ҷмқҖ лҙ„мқҖ м•„лӢҲлӢӨ. к°•мқён•ң мғқлӘ…л Ҙм—җ лҢҖн•ң к№ЁлӢ¬мқҢмқҖ лҸ„м„ңкҙҖм—җм„ң к°•мқҳмӢӨм—җм„ң мұ…мқҙлӮҳ мң лӘ…н•ң мІ н•ҷмһҗм—җкІҢм„ңл§Ң л°°мҡ°лҠ” кІғмқҖ м•„лӢҲлӢӨ. вҖңн—ҲлҰ¬лҘј лӮ®м¶ң мӨ„ м•„лҠ” мӮ¬лһҢвҖқмқҙлқјл©ҙ мқҙ мһ‘мқҖ м ң비кҪғ н•ң нҸ¬кё°м—җм„ңлҸ„ к·ё к№ЁлӢ¬мқҢмқҖ мҳӨлҠ” кІғмқҙлӢӨ. кІён—Ҳн•ҳкІҢ н—ҲлҰ¬лҘј лӮ®м¶”кі мЈјмң„лҘј л‘ҳлҹ¬ліҙмһҗ. 60м—¬ мў…мқҙлӮҳ лҗҳлҠ” м ң비кҪғл“Өмқҙ мғқлӘ…мқҳ нҷҳнқ¬лҘј л…ёлһҳн• кІғмқҙлӢӨ.
кёҖ_ ліөнҡЁк·ј мӢңмқёВ·мӮ¬м§„_ мЎ°кё°мҲҳ

м ң비кҪғ
мһҘлӮңк°җмқҙ нқ”н•ҳм§Җ м•ҠлҚҳ мҳӣ мӢңм Ҳм—җ м ң비кҪғмқҖ м–ҙлҰ° м•„мқҙл“Өмқҳ мһҘлӮңк°җмңјлЎңлҸ„ нӣҢлҘӯн•ң лӘ«мқ„ н•ҙлӮҙм—ҲлӢӨ. м ң비кҪғм—җкІҢлҠ” м•Ҳ лҗҳм—Ҳм§Җл§Ң м–ҙлҰ° мӢңм Ҳ м ң비кҪғмқ„ л”°м„ң л‘җ мҶЎмқҙлҘј м—Үкұём–ҙ вҖҳкҪғм”ЁлҰ„вҖҷмқ„ н•ҳкё°лҸ„ н–Ҳкі , кҪғл°ҳм§ҖлҘј л§Ңл“Өкё°лҸ„ н–ҲлӢӨ. к·ёлһҳм„ң м ң비кҪғмқ„ л°ҳм§ҖкҪғмқҙлқјкі лҸ„ н•ңлӢӨ. кҪғмқҙ м§Җкі м”Ём•—мқҙ л§әнһҲл©ҙ м”ЁлҘј л”°м„ң вҖҳмҢҖл°ҘлҶҖмқҙвҖҷлҸ„ н–ҲлӢӨ. м”Ём•—мқ„ мғҒлҢҖм—җкІҢ ліҙм—¬мЈјкі мҢҖл°Ҙмқём§Җ ліҙлҰ¬л°Ҙмқём§Җ м•Ңм•„л§һнһҲлҸ„лЎқ н•ҳм—¬ м”Ём•—мқ„ мҶҗнҶұ лҒқмңјлЎң к№Ңм„ң лҚң м—¬л¬ё н•ҳм–Җмғү(мҢҖл°Ҙ)мқём§Җ мһҳ мқөмқҖ к°Ҳмғү(ліҙлҰ¬л°Ҙ)мқём§ҖлҘј нҷ•мқён•ҳлҠ” лҶҖмқҙлӢӨ. л¬јлЎ м§ҖкёҲмқҖ мӮ¬лқјм§„ н’ҚкІҪмқҙлӢӨ.
к·ёлҹ°к°Җ н•ҳл©ҙ м ң비кҪғмқҖ м–ҙлҰ° мҲңмқҖ лӮҳл¬јлЎң лЁ№кё°лҸ„ н•ҳкі мң л°©м—ј л“ұ л¶Җмқёлі‘кіј мӨ‘н’Қ, мқҙм§Ҳ, м„ӨмӮ¬, 진нҶө, мқёнӣ„м—ј л“ұмқҳ м№ҳлЈҢм—җ м•Ҫмһ¬лЎң мӮ¬мҡ©н•ҳл©° л°ңмңЎмҙү진м ң, к°„мһҘкё°лҠҘмҙү진м ңлЎң м“°мқёлӢӨкі н•ңлӢӨ. мҡ”мҰҲмқҢмқҖ мӢқмҡ©кҪғмңјлЎң л°Ҙм—җ л„Јм–ҙ кҪғл°Ҙмқ„ н•ҙлЁ№кё°лҸ„ н•ңлӢӨ. нҷ”м „мқ„ л¶Җм№ҳлҠ” лҚ°лҸ„ м“°м—¬ н•ҳм–Җ л–Ў мң„м—җ лҶ“мқё кҪғмһҺмқҖ лЁ№кё°м—җлҸ„ м•„к№Ңмҡ°лҰ¬ л§ҢнҒј кіұлӢӨ. мқҙмҜӨ лҗҳл©ҙ мҡ°лҰ¬ лҜјмЎұкіјлҠ” л–јл Өм•ј л—„ мҲҳ м—ҶлҠ” м•јмғқмҙҲлқјлҠ” кІҢ мһ…мҰқлҗң м…ҲмқҙлӢӨ.
к·ёлҹ° м ң비кҪғмқҙ м°ё м–өмҡён•ң лҳҗ лӢӨлҘё мқҙлҰ„мқ„ к°–кі мһҲлӢӨ. мқҙлҰ„н•ҳм—¬ вҖҳмҳӨлһ‘мәҗкҪғвҖҷмқҙлӢӨ.
- кёҙ м„ёмӣ”мқ„ мҳӨлһ‘мәҗмҷҖмқҳ мӢёнқ м—җ мӮҙм•ҳлӢӨлҠ” мҡ°лҰ¬мқҳ лЁём–ё мЎ°мғҒл“Өмқҙ л„ҲлҘј л¶Ҳлҹ¬ вҖҳмҳӨлһ‘мәҗкҪғвҖҷмқҙлқј н–ҲмңјлӢҲ м–ҙм°Ң ліҙл©ҙ л„Ҳмқҳ л’Өг……лӘЁм–‘мқҙ лЁёлҰ¬нғңлҘј л“ңлҰ¬мқё мҳӨлһ‘мәҗмқҳ л’Өг……лЁёлҰ¬мҷҖлҸ„ к°ҷмқҖ к№ҢлӢӯмқҙлқј м јн•ңлӢӨ -
м•„лӮҷлҸ„ мҡ°л‘җлЁёлҰ¬лҸ„ лҸҢліј мғҲ м—Ҷмқҙ к°”лӢЁлӢӨ
лҸ„лһҳмғҳлҸ„ лқім§‘лҸ„ лІ„лҰ¬кі к°• кұҙл„ҲлЎң м«“кІЁ к°”лӢЁлӢӨ
кі л Ө мһҘкө°лӢҳ л¬ҙм§Җл¬ҙм§Җ мІҳл“ңлҹ¬мҷҖ
мҳӨлһ‘мәҗлҠ” к°Җлһ‘мһҺмІҳлҹј көҙлҹ¬ к°”лӢЁлӢӨ
кө¬лҰ„мқҙ лӘЁнҳҖ кіЁм§қ кіЁм§қмқ„ кө¬лҰ„мқҙ нқҳлҹ¬
л°ұ л…„мқҙ лӘҮ л°ұ л…„мқҙ л’ӨлҘј лӢҲм–ҙ нқҳлҹ¬к°”лӮҳ
л„ҲлҠ” мҳӨлһ‘мәҗмқҳ н”ј н•ң л°©мҡё л°ӣм§Җ м•Ҡм—ҲкІғл§Ң
мҳӨлһ‘мәҗкҪғ
л„ҲлҠ” лҸҢк°Җл§ҲлҸ„ н„ёл©”нҲ¬лҰ¬лҸ„ лӘ°мңјлҠ” мҳӨлһ‘мәҗкҪғ
л‘җ нҢ”лЎң н•ҙг……л№ӣмқ„ л§үм•„ мӨ„к»ҳ
мҡём–ҙліҙл ҙ лӘ©лҶ“м•„ мҡём–ҙлӮҳ ліҙл ҙ мҳӨлһ‘мәҗкҪғ
мқҙмҡ©м•… <мҳӨлһ‘мәҗкҪғ>м „л¬ё

кі к№”м ң비кҪғ

лӮЁмӮ°м ң비кҪғ

л…ёлһ‘м ң비кҪғ
вҖңмҳӨлһ‘мәҗмқҳ н”ј н•ң л°©мҡё л°ӣм§Җ м•Ҡм—ҲкІғл§ҢвҖқ мҳӨлһ‘мәҗмқҳ лЁёлҰ¬ лӘЁм–‘кіј лӢ®м•ҳкё° л•Ңл¬ём—җ мҳӨлһ‘мәҗкҪғмқҙлқј л¶ҲлҰ¬лҠ” кІғмқёлҚ°, мҡ°лҰ¬ лҜјмЎұмқҙ мқјм ңмқҳ нғ„м••мңјлЎң мқён•ҙ к·ё мҳӣлӮ кі л Ө мһҘкө°м—җкІҢ м«“кё°лҚҳ мҳӨлһ‘мәҗмҷҖ к°ҷлӢӨлҠ” нҳ„мӢӨ мқёмӢқмқҙ мқҙ мӢңмқҳ мЈјмҡ” лӮҙмҡ©мқ„ мқҙлЈЁкі мһҲлӢӨ. мқјм ңм—җ мқҳн•ҙ мҳӨлһ‘мәҗ м·Ёкёүмқ„ л°ӣмңјл©° лӮҳлқјлҸ„ мһғкі л– лҸҢлҚҳ мң лһ‘лҜј мӢ м„ё, мЎ°м„ лҜјмӨ‘мқҳ м–өмҡён•Ёкіј 비нҶөн•Ёмқ„ м•”мӢңн•ҳлҠ” кІғмқҙ вҖҳмҳӨлһ‘мәҗкҪғвҖҷмқё кІғмқҙлӢӨ. вҖңмҡё л°‘м—җ лҙүм„ нҷ”вҖқмҷҖ к°ҷмқҖ мқҙлҜём§Җлқјкі лӮҳ н• к№Ң.
м–‘м§Җ мӘҪмқ„ л”°лқј лӢҙ л°‘м—җлҸ„ мһҘлҸ…лҢҖм—җлҸ„ н”јкі , мӢңл©ҳнҠё лё”лЎқ нӢҲм—җлҸ„ л¬ҙлҚӨк°Җм—җлҸ„ мӮ°л№„нғҲмқҙлӮҳ лҶ’мқҖ мӮ°м—җлҸ„ н”јм–ҙлӮңлӢӨ. мҪ©м•Ңл§Ңн•ң мҪ©м ң비кҪғм—җм„ң нҒјм§Ғн•ң мӮјмғүм ң비кҪғ, н•ҳм–Җ лӮЁмғүм ң비кҪғ, м – л№ӣк№”мқҳ нқ°м –м ң비кҪғ, лҶ’мқҖ мӮ°м—җм„ңл§Ң мЈјлЎң мһҗлқјлҠ” л…ёлһ‘м ң비кҪғ, м§ҖлҰ¬мӮ° нҷ”м—„мӮ¬ к·јл°©м—җм„ң мһҗмғқн•ңлӢӨ н•ҙм„ң нҷ”м—„м ң비кҪғ л“ұл“ұ к·ё мһҺмқҳ лӘЁм–‘лҸ„ к°Җм§Җк°Җм§Җкі кҪғмқҳ лӢӨм–‘н•ң нҒ¬кё°лӮҳ мғүк№”л§ҢнҒјмқҙлӮҳ к·ё мқҙлҰ„ лҳҗн•ң м—¬лҹ¬ к°Җм§ҖмқҙлӢӨ. мқҙлҠ” лӘЁл‘җ м ң비кҪғмқҳ к°•н•ң лІҲмӢқл Ҙкіј мғқлӘ…л Ҙм—җм„ң 비лЎҜлҗң кІғмқёлҚ° м ң비кҪғл§ҢнҒј к°•н•ң лІҲмӢқл Ҙкіј мғқлӘ…л Ҙмқ„ к°Җ진 м•јмғқмҙҲлҸ„ л“ңл¬јм§Җ м•Ҡмқ„к№Ң н•ңлӢӨ.
м ң비кҪғмқҖ 4мӣ”кіј 5мӣ”м—җ н•ҖлӢӨ. к·ёлҰ¬н•ҳм—¬ м•”мҲ м—җ мҲҳмҲ мқҳ кҪғл°Ҙмқҙ мӢӨл ӨмҷҖ м”Ём•—мқ„(к°ңл°©нҷ”) л§әлҠ”лӢӨ. к·ёлҹ¬лӮҳ кҪғмІ мқҙ м§ҖлӮҳ кҪғмқҙ н”јм§Җ м•Ҡм•„лҸ„ кҪғмқҙ л§әнһҲлҠ” л“Ҝн•ҳлӢӨк°Җ кҪғмқҖ н”јм§Җ м•Ҡкі кі§л°”лЎң м”Ём•—мқҙ л§әнҳҖ(нҸҗмҮ„нҷ”) м—¬л¬ёлӢӨ. м°ё мӢ кё°н•ң лІҲмӢқ л°©лІ•мқҙлӢӨ. лӢӨлҘё к°ңмІҙмҷҖ кҪғк°ҖлЈЁл°ӣмқҙлҘј н•ҳм—¬ лӢӨм–‘н•ң мң м „мһҗлҘј л°ӣм•„л“Өм—¬ мў…мЎұмқ„ мқҙм–ҙк°ҖлҠ”к°Җ н•ҳл©ҙ н•ңнҺёмңјлЎ мһҗкё° мҠӨмҠӨлЎң кҪғк°ҖлЈЁл°ӣмқҙлҘј н•ҳм—¬ мҲңмҲҳнҳҲнҶөмқ„ мқҙм–ҙк°Җкё°лҸ„ н•ҳлҠ” кІғмқҙлӢӨ. кҪғмқ„ н”јмҡ°м§Җ м•Ҡкі лҸ„ м”Ём•—мқ„ л§әлӢӨлӢҲ, лҶҖлһҚм§Җ м•ҠмқҖк°Җ? к·ёлҹ° мӢқл¬јмқҙ лҚ”лҹ¬ мһҲлӢӨкі н•ңлӢӨ. кі л§ҲлҰ¬лҸ„ мғҲмҪ©лҸ„ к°ңнҷ”мҷҖ н•Ёк»ҳ нҸҗмҮ„нҷ”лЎң м”Ём•—мқ„ л§әкё°лҸ„ н•ңлӢӨ. к°ңл°©нҷ”лҠ” м—ҙл§ӨлҘј л§әмқ„ нҷ•лҘ мқҙ к·ёлҰ¬ лҶ’м§Җ м•ҠмқҖ л°ҳл©ҙ нҸҗмҮ„нҷ”лҠ” л§Өмҡ° лҶ’лӢӨкі н•ңлӢӨ.
мқҙ м”Ём•—мқҖ мқөмңјл©ҙ н„°м ём„ң л©ҖлҰ¬ нқ©м–ҙм§ҖлҠ”лҚ° мһ¬лҜёмһҲлҠ” мӮ¬мӢӨмқҖ мқҙ м”Ём•—мқ„ л„җлҰ¬ нҚјлңЁлҰ¬лҠ” лҚ°м—җ к°ңлҜёк°Җ лҸ„мҷҖмӨҖлӢӨлҠ” кІғмқҙлӢӨ. мқҙ м ң비кҪғмқҳ м”Ём•—м—җлҠ” к°ңлҜёк°Җ мўӢм•„н•ҳлҠ” вҖҳм–јлқјмқҙмҳӨмўҖвҖҷмқҙлқјлҠ” лӢЁл§ӣмқҙ лӮҳлҠ” л¬јм§Ҳмқҙ 묻м–ҙ мһҲлҠ”лҚ° к°ңлҜёк°Җ мқҙкІғмқ„ лЁ№кё° мң„н•ҳм—¬ м”Ём•—мқ„ л¬јкі к°”лӢӨк°Җ м—¬кё°м Җкё° м”Ём•—мқ„ мҳ®кІЁлҶ“лҠ”лӢӨкі н•ңлӢӨ. м–јл Ҳм§ҖлӮҳ к№Ҫк№Ҫмқҙн’ҖлҸ„ к·ёл Үл“Ҝмқҙ к°ңлҜёк°Җ лҸ„мҷҖмӨҖлӢӨ. кіөмғқкҙҖкі„м—җ мһҲлҠ” кІғмқҙлӢӨ. м ң비кҪғмқҖ мҷ•м„ұн•ң лІҲмӢқл Ҙкіј н•Ёк»ҳ лӢӨлҘё лҸҷл¬јмқҳ лҸ„мӣҖк№Ңм§Җ кІ№міҗ к·ё мў…мЎұмқ„ лІҲм°Ҫн•ҳкІҢ л§Ңл“ңлҠ” лҚ° к°ҖмһҘ мңјлңёмқј мҲҳл°–м—җ м—ҶлҠ” кІғ м•„лӢҢк°Җ мӢ¶лӢӨ.
лҙ„мқҙлӢӨ. мӢңмқё м•ҲлҸ„нҳ„мқҳ мӢңм—җм„ңмІҳлҹј вҖңм ң비кҪғмқ„ лӘ°лқјлҸ„ лҙ„мқҖ мҳӨкі м ң비кҪғмқ„ м•Ңм•„лҸ„ лҙ„мқҖ к°„лӢӨ.вҖқ к·ёлҹ¬лӮҳ лӢӨ к°ҷмқҖ лҙ„мқҖ м•„лӢҲлӢӨ. к°•мқён•ң мғқлӘ…л Ҙм—җ лҢҖн•ң к№ЁлӢ¬мқҢмқҖ лҸ„м„ңкҙҖм—җм„ң к°•мқҳмӢӨм—җм„ң мұ…мқҙлӮҳ мң лӘ…н•ң мІ н•ҷмһҗм—җкІҢм„ңл§Ң л°°мҡ°лҠ” кІғмқҖ м•„лӢҲлӢӨ. вҖңн—ҲлҰ¬лҘј лӮ®м¶ң мӨ„ м•„лҠ” мӮ¬лһҢвҖқмқҙлқјл©ҙ мқҙ мһ‘мқҖ м ң비кҪғ н•ң нҸ¬кё°м—җм„ңлҸ„ к·ё к№ЁлӢ¬мқҢмқҖ мҳӨлҠ” кІғмқҙлӢӨ. кІён—Ҳн•ҳкІҢ н—ҲлҰ¬лҘј лӮ®м¶”кі мЈјмң„лҘј л‘ҳлҹ¬ліҙмһҗ. 60м—¬ мў…мқҙлӮҳ лҗҳлҠ” м ң비кҪғл“Өмқҙ мғқлӘ…мқҳ нҷҳнқ¬лҘј л…ёлһҳн• кІғмқҙлӢӨ.
кёҖ_ ліөнҡЁк·ј мӢңмқёВ·мӮ¬м§„_ мЎ°кё°мҲҳ
Copyright в“’ м„ңмҡёмӢ л¬ё All rights reserved. л¬ҙлӢЁ м „мһ¬-мһ¬л°°нҸ¬, AI н•ҷмҠө л°Ҹ нҷңмҡ© кёҲм§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