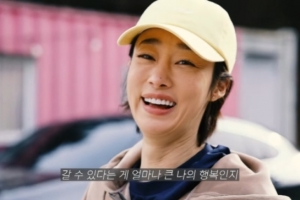탈북자에 대해 비난 일색이었던 북한이 최근 이들의 열악한 삶을 부각하고 향수를 자극하며 재입북을 권유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일 ‘차례진 것은 천대와 멸시, 막심한 후회’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한 탈북자들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다며 “공화국(북한)의 품으로 돌아가려는 열망이 높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중 대다수가 낮은 소득과 사회적 편견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견디다 못해 결국 ‘범죄의 길’로 빠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당국이 “비록 죄를 지은 자식이라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려는 사람들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고 선전했다.
특히 “고난의 언덕을 딛고 올라선 조국은 그 사이 천지개벽했다. 탈북자들의 고향과 마을도 몰라보게 변했고 친척·친구들도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며 최근 북한의 경제사정이 이전보다 개선됐음을 부각했다.
앞서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도 지난달 28일 우리민족끼리 기자와의 문답에서 재입북하는 탈북자들을 언제든 받아줄 준비가 돼 있다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권유했다.
다만 북한 매체는 북한 인권문제를 폭로하고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가며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탈북자를 ‘배신자’로 매도하며 비난만 하던 북한이 유화적인 어조로 탈북자들에게 재입북을 권유하는 것은 이전에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던 모습이다.
북한 매체의 이중적인 대응은 가난한 삶을 견디지 못해 고향을 등진 ‘생계형 탈북자’만이라도 우선 포섭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정은 체제 들어 시장 확대 등을 통해 다소 개선된 경제사정을 내세워 ‘부적응’ 탈북자들을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다시 유인하고 이를 통해 인권 문제에도 대응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수는 북한 경제가 ‘바닥’을 쳤던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꾸준히 늘어나 2009년 3천여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중 상당수는 배고품을 못이겨 탈출한 생계형 탈북자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탈북자는 “국내 탈북자 중 함경도·양강도 출신이 많은 데 이들 중 상당수는 가난이 싫어 탈북한 사람들”이라며 “최근 이같은 북한 매체의 재입북 권유 선전에 흔들리는 탈북민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자의 향수를 자극해 북한 인권운동의 주요 동력인 ‘탈북자 사회’를 분열시키려는 대남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한사회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정서적으로 탈북자들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경제사정이 나아진 것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일 ‘차례진 것은 천대와 멸시, 막심한 후회’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한 탈북자들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다며 “공화국(북한)의 품으로 돌아가려는 열망이 높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중 대다수가 낮은 소득과 사회적 편견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견디다 못해 결국 ‘범죄의 길’로 빠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당국이 “비록 죄를 지은 자식이라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려는 사람들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고 선전했다.
특히 “고난의 언덕을 딛고 올라선 조국은 그 사이 천지개벽했다. 탈북자들의 고향과 마을도 몰라보게 변했고 친척·친구들도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며 최근 북한의 경제사정이 이전보다 개선됐음을 부각했다.
앞서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도 지난달 28일 우리민족끼리 기자와의 문답에서 재입북하는 탈북자들을 언제든 받아줄 준비가 돼 있다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권유했다.
다만 북한 매체는 북한 인권문제를 폭로하고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가며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탈북자를 ‘배신자’로 매도하며 비난만 하던 북한이 유화적인 어조로 탈북자들에게 재입북을 권유하는 것은 이전에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던 모습이다.
북한 매체의 이중적인 대응은 가난한 삶을 견디지 못해 고향을 등진 ‘생계형 탈북자’만이라도 우선 포섭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정은 체제 들어 시장 확대 등을 통해 다소 개선된 경제사정을 내세워 ‘부적응’ 탈북자들을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다시 유인하고 이를 통해 인권 문제에도 대응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수는 북한 경제가 ‘바닥’을 쳤던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꾸준히 늘어나 2009년 3천여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중 상당수는 배고품을 못이겨 탈출한 생계형 탈북자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탈북자는 “국내 탈북자 중 함경도·양강도 출신이 많은 데 이들 중 상당수는 가난이 싫어 탈북한 사람들”이라며 “최근 이같은 북한 매체의 재입북 권유 선전에 흔들리는 탈북민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자의 향수를 자극해 북한 인권운동의 주요 동력인 ‘탈북자 사회’를 분열시키려는 대남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한사회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정서적으로 탈북자들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경제사정이 나아진 것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