лӢӨл¬ёнҷ”көҗмӮ¬л“Ө көҗмңЎнҳ„мһҘм—җ мғҲл°”лһҢ
вҖңм–өм§ҖлЎң мӢңмјңм„ңлҠ” м•Ҳ лҗ©лӢҲлӢӨ. лӢӨл¬ёнҷ” к°Җм • н•ҷмғқкіј м–ҙмҡёлҰ¬лҠ” кІҢ м–јл§ҲлӮҳ мһ¬лҜёмһҲлҠ” мқјмқём§Җ, к·ёлҹјмңјлЎңмҚЁ м–јл§ҲлӮҳ н’Қл¶Җн•ң кІҪн—ҳмқ„ мҢ“мқ„ мҲҳ мһҲлҠ”м§Җ н•Ёк»ҳ м–ҙмҡёл Ө лҶҖл©ҙм„ң мҠӨмҠӨлЎң к№Ёмҡ°міҗм•ј н•©лӢҲлӢӨ.вҖқ м§ҖлӮңн•ҙ 8мӣ”л¶Җн„° м„ңмҡё м„ңмҙҲлҸҷ м„ңмҡёкөҗмңЎлҢҖн•ҷмӣҗм—җм„ң л°ҳл…„ лҸҷм•Ҳ м—°мҲҳлҘј л°ӣкі , мҳ¬н•ҙ мҙҲл¶Җн„° м„ңмҡё мӢ м •мҙҲм—җм„ң м „көҗмғқмқ„ лҢҖмғҒмңјлЎң лӢӨл¬ёнҷ” н•ҷмғқкіј м–ҙмҡёлҰ¬лҠ” лІ•мқ„ к°ҖлҘҙм№ҳлҠ” мқҙлӮҳм§Ғ(м—¬В·35)м”ЁлҠ” мһҗмӢ мқҳ мӢ л…җмқ„ мқҙл ҮкІҢ л°қнҳ”лӢӨ. к·ёлҠ” вҖңм ңк°Җ н•ҳлҠ” көҗмңЎмқҖ м§ҖмӢқмқ„ мҢ“м•„мЈјмһҗлҠ” кІҢ м•„лӢҲлқј лҚ”л¶Ҳм–ҙ мӮҙкё°вҖқлқјкі м„ӨлӘ…н–ҲлӢӨ.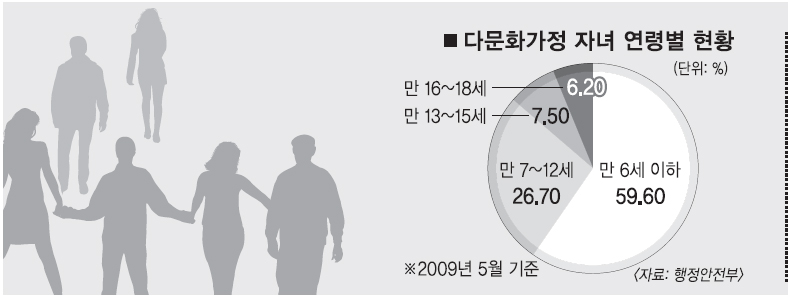
м§ҖлӮң 13мқј мӢ м •мҙҲ 2н•ҷл…„4л°ҳ көҗмӢӨм—җм„ң мқҙ көҗмӮ¬к°Җ 진н–үн•ң мҲҳм—…лҸ„ м–ёлң» лҙҗм„ңлҠ” лҶҖмқҙмҷҖ лӢӨлҘј л°” м—Ҷм—ҲлӢӨ. мқҙ көҗмӮ¬лҠ” 6лӘ…мқҙ н•ң мЎ°к°Җ лҗҳлҸ„лЎқ мұ…мғҒмқ„ н•©м№ҳлҚ”лӢҲ, 12кёҖмһҗлЎң лҗң н•ңкёҖ лӮұл§җ нҚјмҰҗмқ„ лӮҳлҲ мӨ¬лӢӨ.
нҚјмҰҗ мЎ°к°Ғмқ„ к°ҖмһҘ лЁјм Җ л§һм¶ҳ нҢҖмқҖ вҖңлӘЁВ·мҠөВ·мқҖВ·лӢ¬В·лқјВ·лҸ„В·л§ҲВ·мқҢВ·мқҖВ·к°ҷВ·м•„В·мҡ”.вҖқлқјкі нҒ¬кІҢ мҷёміӨлӢӨ. л’Өмқҙм–ҙ лӢӨлҘё мұ…мғҒм—җм„ңлҸ„ к°ҷмқҖ мҷём№Ёмқҙ лӮҳмҷ”лӢӨ. вҖңлӘЁмҠөмқҖ лӢ¬лқјлҸ„ л§ҲмқҢмқҖ к°ҷм•„мҡ”.вҖқлқјлҠ” л§җмқҳ лң»мқ„ к°ҖмҠҙмңјлЎң мқҙн•ҙн•ңлӢӨл©ҙ, мқҙ көҗмӮ¬ мҲҳм—…м—җм„ң л°ұм җмқ„ л°ӣлҠ” кІғмқҙлӢӨ.
вҖңм Җн•ҷл…„мқјмҲҳлЎқ мҲҳм—…м—җ 집мӨ‘мӢңнӮӨкё°к°Җ нһҳл“ӨмЈ . н•ҷкё° мҙҲм—җлҠ” нҶөм ңк°Җ мһҳ м•ҲлҸјм„ң м–ҙл ӨмӣҖмқ„ кІӘкё°лҸ„ н–ҲмҠөлӢҲлӢӨ. лӢӨл¬ёнҷ” мӮ¬нҡҢк°Җ м–ҙл–Ө мӮ¬нҡҢмқём§Җ к°ңл…җмқ„ мқҙн•ҙмӢңнӮӨкё°лҸ„ м–ҙл Өмӣ кі мҡ”. н•ҳм§Җл§Ң мқјлӢЁ мҲҳм—…мқ„ лӢӨ л“Өмңјл©ҙ м Җн•ҷл…„ н•ҷмғқмқјмҲҳлЎқ нҡЁкіјк°Җ нҒ¬кІҢ лӮҳнғҖлӮ©лӢҲлӢӨ. мҷёкөӯмқём—җ лҢҖн•ң нҺёкІ¬мқҙ мһҗлҰ¬мһЎкё° м „м—җ көҗмңЎмқ„ мӢңнӮ¬ мҲҳ мһҲмңјлӢҲк№Ңмҡ”.вҖқ
м§ҖлӮң н•ҷкё°, л°ҳл…„ лҸҷм•Ҳ мҲҳм—…мқ„ н•ҙліё л’Ө мқҙ көҗмӮ¬лҠ” н•ҷл…„лі„, м„ұлі„ нҠ№м„ұм—җ л§һм¶°м„ң лӢӨл¬ёнҷ” мӮ¬нҡҢ көҗмңЎмқ„ мӢӨмӢңн•ҙм•ј н•ңлӢӨлҠ” м җмқ„ к№ЁлӢ¬м•ҳлӢӨ. л§җ к·ёлҢҖлЎң вҖҳмӮҙм•„к°ҖлҠ” л°©лІ•вҖҷм—җ лҢҖн•ң көҗмңЎмқҙкё° л•Ңл¬ём—җ н•ҷмғқ к°ңк°ңмқёмқҙ к°–кі мһҲлҠ” нҺёкІ¬мқ„ м–ҙл–»кІҢ к·№ліөн• м§Җ вҖҳл§һм¶Өнҳ• мІҳл°©вҖҷмқ„ лӮҙл Өм•ј н•ңлӢӨлҠ” лң»мқҙлӢӨ.

м Җн•ҷл…„мқҳ кІҪмҡ°м—җлҠ” лӢӨл¬ёнҷ” мӮ¬нҡҢм—җ лҢҖн•ң мЈјмқҳлҘј нҷҳкё°мӢңнӮӨл©° лҶҖмқҙ л°©мӢқмңјлЎң мҲҳм—…мқ„ н•ҙм•ј н•ҳкі , кі н•ҷл…„мқҳ кІҪмҡ° мқҙлҜё нҳ•м„ұлҗң нҺёкІ¬мқ„ 짧мқҖ мӢңк°„ лҸҷм•Ҳ м—Ҷм• мЈјлҠ” нҷңлҸҷмқҙ н•„мҡ”н•ҳлӢӨ. н•ҷм—… л¶ҖлӢҙмқҙ л§ҺмқҖ кі н•ҷл…„м—җм„ңлҠ” лӢӨл¬ёнҷ” мӮ¬нҡҢлҘј к°ҖлҘҙм№ мӢңк°„мқҙ л¶ҖмЎұн•ҳкё° л•Ңл¬ём—җ 압축м ҒмңјлЎң к°ҖлҘҙм№ н•„мҡ”к°Җ мһҲлӢӨлҠ” м–ҳкё°лӢӨ.
мқҙ көҗмӮ¬лҠ” вҖңмӢ м •мҙҲм—җ лӢӨл¬ёнҷ” к°Җм • м¶ңмӢ н•ҷмғқ 11лӘ…мқҙ лӢӨлӢҲкі мһҲлӢӨ.вҖқл©ҙм„ң вҖңлҢҖл¶Җ분мқҳ н•ҷмғқл“Өмқҙ н•ҷкөҗм—җм„ң лӢӨл¬ёнҷ” к°Җм • н•ҷмғқмқ„ л§ҢлӮҳкІҢ лҗҳм§Җл§Ң, мқҙл“Өкіј м–ҙл–»кІҢ м–ҙмҡёлҰ¬лҠ”м§Җ л°°мҡ°м§Җ лӘ»н•ҙм„ң к°Ҳл“ұмқ„ л№ҡлҠ” кІҪмҡ°лҠ” л°©м§Җн•ҙм•ј н•ңлӢӨ.вҖқкі н–ҲлӢӨ.
н•ҷл…„лі„лЎң л§һм¶Өнҳ• көҗмңЎмқҙ н•„мҡ”н•ҳлӢӨлҠ” мғқк°ҒмқҖ мқҙ көҗмӮ¬мҷҖ н•Ёк»ҳ нҳ„мһҘм—җ нҲ¬мһ…лҗң мқҙмӨ‘м–ём–ҙ көҗмӮ¬ 63лӘ…мқҙ кіөк°җн•ҳлҠ” лӮҙмҡ©мқҙлӢӨ.
көҗмӮ¬л“ӨлҒјлҰ¬ мҲҳм—… м •ліҙлҘј көҗнҷҳн•ҳлҠ” мқён„°л„· м№ҙнҺҳм—җлҠ” вҖң1н•ҷл…„ н•ҷмғқл“ӨмқҖ л„Ҳл¬ҙ л– л“Өм–ҙм„ң мҲҳм—…м—җ 집мӨ‘н•ҳм§Җ м•ҠлҠ”лӢӨ.вҖқкұ°лӮҳ вҖңн•ҷмғқл“Өмқҙ лӮҙк°Җ н•ҳлҠ” н•ңкөӯл§җмқ„ м ңлҢҖлЎң м•Ңм•„л“ЈлҠ”м§Җ кұұм •лҗңлӢӨ.вҖқлҠ” кі лҜјмқҙ мӢ¬мӢ¬м№ҳм•ҠкІҢ мҳ¬лқјмҳЁлӢ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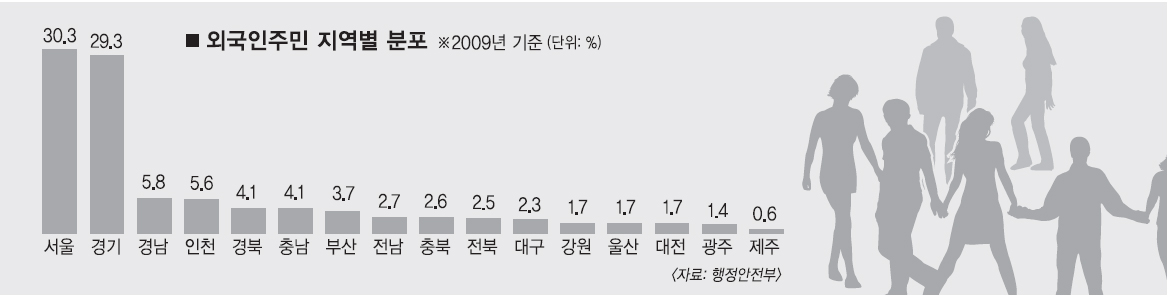
лӢ№мҙҲ м§ҖлӮңн•ҙ м—°мҲҳлҘј л°ӣлҚҳ 72лӘ… к°ҖмҡҙлҚ° 50%к°Җ мқјліёмқё, 20%к°Җ мӨ‘көӯмқёмқҙм—ҲмңјлӢҲ көҗмӮ¬ мҠӨмҠӨлЎң н•ңкөӯм–ҙ мӢӨл Ҙм—җ лҢҖн•ҙ мҡ°л ӨлҘј н•ҳлҠ” кІғмқҙлӢӨ.
мқҙлҹ° кі лҜјмқҙ мҳ¬лқјмҳӨл©ҙ кі§ н•ҙкІ°л°©лІ•м—җ лҢҖн•ң мқҳкІ¬мқҙлӮҳ мҲҳм—…м—җм„ң нҡЁкіјлҘј ліё мһҗлЈҢл“Өмқҙ лҢ“кёҖлЎң м№ҙнҺҳм—җ мҳӨлҘёлӢӨ.
көҗмӮ¬л“Ө мҠӨмҠӨлЎңк°Җ лӢӨл¬ёнҷ” к°Җм •мқҳ мқјмӣҗмңјлЎңм„ң л¬ём ңмқҳ мӢ¬к°Ғм„ұмқ„ кі лҜјн•ҳкі мһҲкё° л•Ңл¬ём—җ мқјл°ҳкөҗмӮ¬л“ӨліҙлӢӨ м—ҙм •л©ҙм—җм„ң л’Өм§Җм§Җ м•ҠлҠ”лӢӨкі мқҙ көҗмӮ¬лҠ” м„ӨлӘ…н–ҲлӢӨ. к·ёлһҳм„ң мқҙмӨ‘м–ём–ҙ к°•мӮ¬л“ӨмқҖ л°©кіјнӣ„ көҗмӢӨм—җм„ң мӨ‘көӯм–ҙлӮҳ мқјліём–ҙ к°ҷмқҖ мҷёкөӯм–ҙлҘј к°ҖлҘҙм№ҳлҠ” мҲҳм—…мқ„ н•Ёк»ҳ л§Ўкё°лҸ„ н•ңлӢӨ.
нӮӨлҘҙкё°мҠӨмҠӨнғ„м—җм„ң кі л“ұн•ҷкөҗ көҗмӮ¬лЎң к·јл¬ҙн•ҳлӢӨк°Җ 8л…„ м „ н•ңкөӯм—җм„ң нҢҢкІ¬ мҳЁ лӮЁнҺёмқ„ л§ҢлӮҳ м„ңмҡёлЎң мҳЁ мқҙ көҗмӮ¬лҸ„ мҙҲл“ұн•ҷмғқ мһҗл…Җ 2лӘ…мқ„ л‘” м—„л§ҲмқҙлӢӨ. к·ёлҠ” вҖңл§үмғҒ көҗмӮ¬лЎң лӢӨмӢң мқјн•ҳл Өкі н•ҳлӢҲ м•„м§Ғ м—„л§Ҳ мҶҗмқҙ н•„мҡ”н•ң л‘җ л”ёмқҙ кұёлҰ¬кё°лҸ„ н–Ҳм§Җл§Ң, лӢӨл¬ёнҷ” к°Җм •мқ„ л°°л Өн•ҳлҠ” мӮ¬нҡҢк°Җ л§Ңл“Өм–ҙм ём•ј л‘җ л”ём—җкІҢлҸ„ лҸ„мӣҖмқҙ лҗ кІғмқҙлқјлҠ” мғқк°Ғм—җ көҗм§Ғм—җ лӮҳм„ңкІҢ лҗҗлӢӨ.вҖқкі л§җн–ҲлӢӨ. нӮӨлҘҙкё°мҠӨмҠӨнғ„м—җм„ң лҢҖн•ҷ көҗмңЎк№Ңм§Җ л°ӣм•ҳм§Җл§Ң, мҷёкөӯмқёмқҙлқјлҠ” м°Ёлі„ л•Ңл¬ём—җ н•ңкөӯм—җм„ң мӮ¬нҡҢ нҷңлҸҷмқҖ м»Өл…• мһ„мӢңм§ҒлҸ„ лӘ» кө¬н•ң мһҗмӢ мқҳ м• нҷҳмқ„ л¬јл ӨмЈјм§Җ м•ҠкІ лӢӨлҠ” мқҳм§Җк°Җ 묻м–ҙлӮ¬лӢӨ.
к№Җм •мӣҗ м„ңмҡёкөҗлҢҖ лӢӨл¬ёнҷ”м—°кө¬мӣҗмһҘмқҖ вҖңмқҙмӨ‘м–ём–ҙ көҗмӮ¬лҠ” н•ңкөӯм–ҙмҷҖ мһҗкөӯм–ҙлҘј лҸҷмӢңм—җ кө¬мӮ¬н• мҲҳ мһҲлҠ” мһҘм җмқ„ м§ҖлӢҢлҚ°лӢӨ мҠӨмҠӨлЎңк°Җ лӢӨл¬ёнҷ” к°Җм •мқҳ лӢ№мӮ¬мһҗмқҙкё° л•Ңл¬ём—җ м—ҙм •м ҒмқҙлӢӨ.вҖқл©° вҖңлӢӨл¬ёнҷ” мқҙн•ҙ көҗмңЎмқ„ нҶөн•ҙ мҙҲл“ұн•ҷкөҗл¶Җн„° лӢӨл¬ёнҷ”м Ғ к°җмҲҳм„ұмқ„ л°°к°ҖмӢңмјң көӯм ңм Ғмқё мқёмһ¬лҘј кёёлҹ¬лӮј мҲҳ мһҲлҠ” к°ҖлҠҘм„ұмқ„ м ңкіөн• мҲҳ мһҲмқ„ кІғвҖқмқҙлқјкі л§җн–ҲлӢӨ.
мөңмһ¬н—Ңкё°мһҗ goseoul@seoul.co.kr
2010-09-28 9л©ҙ
Copyright в“’ м„ңмҡёмӢ л¬ё All rights reserved. л¬ҙлӢЁ м „мһ¬-мһ¬л°°нҸ¬, AI н•ҷмҠө л°Ҹ нҷңмҡ© кёҲм§Җ







































